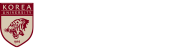Undergraduate
Application Process
2012년 1학기 경영대 교환 학생 경험 보고서
박영진 WU(비엔나 상경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 비엔나, 혹은 빈.
우리 어머니께선 비엔나라는 도시에서 비엔나 소시지만을 떠올리셨지만, 사실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비엔나.
막상 가보면 소시지는 대부분 후랑크소세지 (Frankfruter) 이고, 소시지보다는 오히려 누들과 케밥을 더 많이 먹게 되는 도시.
비엔나에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었다.
“넌 왜 비엔나로 교환 학생을 오게 됐어?”
당연히 궁금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난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ESADE에 가고 싶었다. 혹은 영국의 다른 학교들, 그도 아니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학교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국가들에 가기에 내 학점은 쓰레기였다. 그래도 꼭 유럽으로 가겠다는 일념으로 NUS의 유혹을 뿌리치고 재도전하여, 유럽 학교들은 다 지망했더니 결국 가게 된 곳이 비엔나였다. 처음 몇 번 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그들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살기 좋은 도시라고 들어서” 라고 대답했다. 그들도, 나도 만족할만한 대답은 결국 그거였다.
내가 꼭 유럽에 가고 싶었던, 가야만 했던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그것은 2004년, 내가 고3이었던 시절에 본 영화 ‘유로트립’에서 기인한다. 유럽 여행에 대한 막연한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충족시키든 실망시키든 간에 경험할 수 있을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 그것이 내가 교환 학생을 감으로써 이루려고 한 제 1… 아니 제 2의 목표였다. 제 1의 목표는 물론 당연히 배움이다.
그리하여 기획하게 됐던 게 바로 유럽으로 교환 학생을 가는 학생들의 모임인 ‘유로트립’이다.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작명이긴 하지만, 그러한 모임을 기획한 덕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파리에서 만난 9명 가량 (정확히 기억 안 남) 의 고대생과 함께 한 달팽이 요리를 포함한 레스토랑 코스 요리라든지, 나는 가지 않았지만 오로라를 찾아 떠난 오로라 원정대, 사막과 사랑이 넘쳤던 모로코 여행 등,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럽 여행에 관심 있다면 가입하도록 합시다. 문의는 제 이메일로 주세요.
아무튼, 비엔나 얘기로 돌아오자면, 유럽 도시들은 한국에 비해 물가가 당연히 비싸다. 런던이나 파리는 말 할 것도 없고, 최빈국 그리스나 빚쟁이 이탈리아도 그러하다. 나는 유럽 도시들을 여행 다니며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었던 음식인 케밥의 가격을 비교하여 정리한 ‘박영진의 케밥지수’를 만들었고, 케밥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봤을 땐 비엔나가 평균 3유로로 EU국가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했다(가장 저렴한 도시는 평균 2.5유로의 독일 만하임).
물가뿐만이 아니라 치안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비엔나에서 6개월 간 지내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뿐이었으며, 인종 차별을 경험한 적도 없고, 뭔가를 도둑 맞은 적도 없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밖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의 성향상, 이 정도면 꽤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나와 같이 비엔나로 갔던 09학번의 전양은 집에 돌아왔더니 가방이 누군가의 날카로운 칼로 예리하게 절단돼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으므로 쉽사리 천국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가방이 완전히 잘려 속을 훤히 보여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당한 물품이 없었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갈 만 하지 않을까? 어쩌면 가방을 열어 보니 가난한 학생이라는 게 드러나서 차마 뭘 훔쳐 가지 못했을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답게 한국인 유학생이 많다. 지긋지긋하게 많다. 한인 학생회도 있어서, 한국인들이 그립고 한국말로 떠들고 싶어지면 조심스레 그 쪽과 어울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이 경험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좀 혼란스러워졌다. 과연 내가 비엔나로 교환 학생 갈 것을 권장하며 추천하는 파워블로거 맛집리뷰 같은 글을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느낀 걸 그대로 전달하는 말 그대로의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사실 비엔나를 떠나기 한 달쯤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내가 과연 나중에 비엔나로 돌아올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 굳이 비엔나로 올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온다’ 였다.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나는 그 도시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중세 시대의 간지를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건물들도 사나흘 후면 다 똑같아 보여서 질리고, 독일어를 못 알아들으니 심지어 티비에서 영화 아마겟돈을 틀어 줘도 독일어 더빙판이라 알아 듣지를 못하고, 거리는 일부 번화가를 제외하곤 밤이 되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옷을 좀 사고 싶어 쇼핑을 가도 그리 매력적인 가게나 옷을 발견하긴 힘들고(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음)…… 한여름에 가는 도나우(다뉴브)강변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는 해도, 막상 가면 기대했던 금발 미녀들 보다는 가족 피크닉 나온 중장년층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누워 있는 경우가 많으니.
파리에서 에펠탑과 개선문을 보고 느낀 감동, 로마에서 본 콜로세움과 바티칸의 쌩 삐에뜨로 대성당, 나폴리의 야경, 런던에서 빅 밴을 보고 느낀, 혹은 타워 브릿지를 보고 느낀 감명에 비해 사실 비엔나가 준 감동은 소소 하다고 생각했다. 스테판 성당이나 벨베데레 궁을 보면서도 그냥 “오 멋지네” 하고 말았을 정도니까.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지 10일이 좀 더 지난 지금, 나는 무료로 탈 수 있는 시티바이크를 타고 도나우 강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쌩쌩 달려서, 시민 공원으로 가 나무 사이마다 걸려 있는 해먹에 누워 책을 읽으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싶은 욕망에 불타고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신촌에서 만나 치킨집에서 육 개월만의 치맥을 즐기려다가 찝찝한 맹물 같은 맥주 맛에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했던(느닷없는 신촌 디스) 그 순간부터, 나는 비엔나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파는 500ml에 1유로 가량 하는 맥주들, 그 알싸한 목 넘김, 부드러운 거품, 독특하고 특색 있는 향과 맛, 목 마를 때 한 캔을 통째로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목젖 운동 시키며 마실 수 있던 그…… 맥주를 몰래 여행 가방에 싸 와서 참 다행이다.
아무튼, 비엔나는 얼핏 보면 정말 심심하고 지루해 보이는 도시일지 모른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살기 좋은 도시고 뭐고 딱히 별다른 재미를 느끼진 못했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 6개월 간의 기억이 06학번임에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8학기만 마치고 졸업을 하지 못할 것임이 거의 확실해져서 가족 모두를 불안과 분노에 떨게 만들고 있는 내게 어떤 다른 종류의, 한국에만 있었다면 갖지 못했을 여유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다.
과제를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시민 공원 해먹에 누워 맥주를 한 캔, 아니 두세 캔 마시며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여유. 그렇게 해서 낸 과제가 10점 만점에 3점을 받더라도 다음에 잘 하면 되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그랬는데 그 과제가 평가 점수에서 40%를 차지하는 단 하나의 과제였음이 밝혀졌을 때 살려달라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그리고 그런 여유의 일부, 아니 대부분은 다양한 나라로의 여행을 통해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유럽으로 교환 학생을 가신다면 ‘유로트립’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메일을 통한 친절 상담 가능.
어쨌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색다르고 괜찮은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 하는 이유는 배가 너무 고파서. 아, 그리고, 만약 비엔나에서 전통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도 슈니첼(Schnitzel)을 비싸게 사 먹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차라리 립(Spare ribs)을 먹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