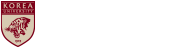뉴스
KUBS 소식
선진국의 사례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모색하다
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17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역사 및 비교연구’ 컨퍼런스 개최
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17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역사 및 비교연구’ 컨퍼런스 개최
지난 8월 17일 ‘2017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역사 및 비교연구’ 컨퍼런스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박경서)와 재단법인 탄천연구포럼(이사장=변대규)이 공동주최로 연 이번 행사엔 국내 주요 기업과 국내외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한 석학들을 포함한 18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환영사에서 변대규 탄천연구포럼 이사장은 “지배구조는 사회의 기관들이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책임지고 기관에 속한 개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장치”라며, “우리보다 앞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고민한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대안을 조사하는데 다양한 시각과 근거를 듣고 토론하고자 한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고려대 경영대학 박경서 교수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쟁점들’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쟁점으로 △집중화된 가족경영 △높은 괴리도(disparity)를 보이는 소유-지배구조 △이사회의 감시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박경서 교수는 재벌기업의 높은 소유-지배 괴리도를 강조했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지배주주 일가가 실제 소유한 지분과 의결권 행사 간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다. 괴리도가 높아지는 만큼 재벌기업 일가는 적은 소유지분으로 막대한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때 경제적 득실에 엄청난 차이를 두며 경영 위험성 책임은 최소한으로 갖게 된다.

박경서 교수는 법과 제도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유-지배 괴리도를 낮추기 위해 지주회사제도란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제론 효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악용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처럼 사전적 규제 장치가 거의 없다”며 “대신 민법상 강력한 처벌로 기업 스스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앨버타 경영대학원(Alberta Business School) 랜달 목(Randall Morck) 교수는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개괄’에 대해 발표했다. 랜달 교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로 1929년 대공황을 꼽았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과 미국 시민들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분야에 계열사를 둔 독점적 피라미드형 대기업의 개혁만이 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어 앨버타 경영대학원(Alberta Business School) 랜달 목(Randall Morck) 교수는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개괄’에 대해 발표했다. 랜달 교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로 1929년 대공황을 꼽았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과 미국 시민들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분야에 계열사를 둔 독점적 피라미드형 대기업의 개혁만이 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로 탄력을 받았다. 랜달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30년대 중반부터 은행의 업무와 증권 업무를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과 공공부문 홀딩컴퍼니 제도(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등으로 미국 기업의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규제했다. 특히 랜달 교수는 해당 규제법의 정치적·사회적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1930년대 초부터 약 20여 년간 루스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미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개혁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랜달 교수의 발표 이후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David Schoenherr 교수는 ‘독일과 한국에서 엘리트 간의 연줄문화와 정경유착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친 영향 비교 분석’을, 옥스퍼드 대학교(Oxford University) Luca Enriques 교수는 ‘유럽의 엔론 사태로 불리는 이탈리아 유제품 기업 파르마라트(Parmalat) 스캔들 이후 유럽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퍼드 대학교(Purdue University) 이준만 교수는 ‘창업자 CEO의 경영 방식과 아시아 기업의 창업자 CEO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 세션을 이어갔다. 마지막 세션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건식 교수의 진행 하에 청중이 참여한 패널토론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